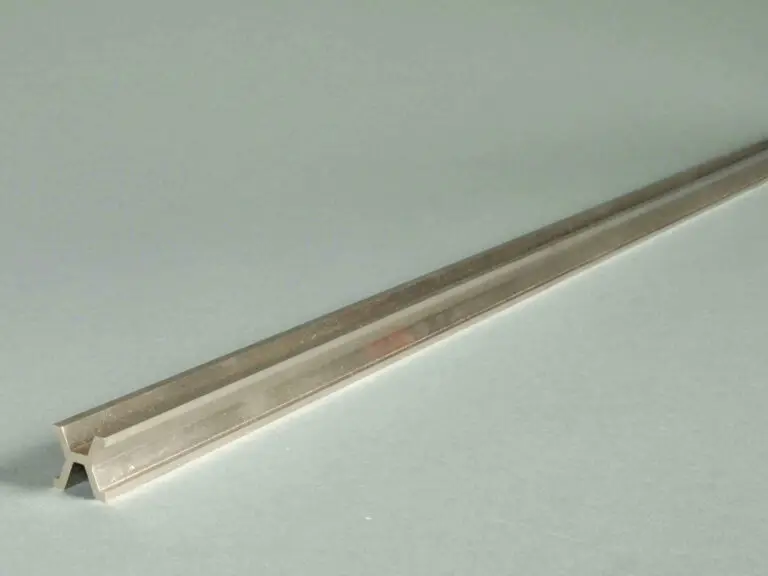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유네스코 타임머신 / 그땐 이런 일도] 한위 60년 뒤안길 들여다보기 II
| 올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위)가 설립된 지 60돌을 맞는 해이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민적 여망을 안고 탄생한 유네스코한위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교육·과학·문화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왔다. 1991년 유엔 가입 이전까지는 한위가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창’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60년, 역사의 뒤안길에 새겨진 한위의 발자취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
미완에 그친 ‘유네스코 자동번역기’
한국의 인재도 10개년 계획 참여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 서로의 풍습과 생활에 대한 무지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세계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을 초래한 공통적인 원인이며….’
1945년 11월 16일 열린 유네스코창설준비위원회에서 37개국 대표들이 영국 런던에 모여 채택한 ‘유네스코 헌장’의 한 대목이다. 유네스코는 서로에 대한 무지와 의사소통의 부족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각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의사전달을 쉽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면 서로의 문화에 대한 무지와 갈등도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과 기대 때문이었을까. 1960년대 초 유네스코는 각국 문화 이해와 교류를 위해 이른바 ‘자동번역기 계획’에 착수한다. 세계 각국에서 권위자 20명을 선발해 10년 동안 자동번역기를 공동연구하려는 계획이었다.
1962년 3월 2일자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인재 한 명이 자동번역기 연구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나이 33세의 이세백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다. 공고 출신의 이 씨는 중앙대학교 정외과를 나왔지만 대학 시절부터 첨단 지폐계산기, 자동투표기 등을 발명해 전시회에 출품했던 발명가이기도 했다.
그가 만든 지폐계산기는 그 시대에는 획기적인 기계였다. 지폐를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숫자를 계산하고 못 쓰는 돈을 가려내며, 스위치를 누르면 원하는 대로 만환이든 10만환이든 묶어져 취급자의 도장까지 찍혀 나오는 것이었다고 한다. 이씨의 재능을 눈여겨본 중앙대 총장 임영신 씨가 졸업 이후에도 후견인 역할을 하며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이 씨는 자동번역기의 기본원리를 규명한 것으로 나온다. 주파수와 광전판 등을 이용해, 기계에다 말을 하면 기계가 단어창고와 연락을 해서 문법기를 통해 원하는 외국어로 발성이 나도록 되어 있는 번역기계를 제작 중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활동 덕분에 유네스코 본부로부터 임영신 총장 앞으로 ‘추천장을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했다는 것.
그러나 유네스코의 ‘자동번역기 10년 계획’은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미완에 그치고 만다.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완벽한 자동번역기가 나오기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하면 반세기 전의 시도가 벽에 부딪힌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했다. 만약 그 시절 유네스코 자동번역기가 완성됐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 아마도 세계의 평화 지도가 적어도 한 뼘은 넓어지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