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관의 언어생활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에서는 어떤 말을 쓸까요? 유엔과 마찬가지로 유네스코는 공식적으로 6개 언어(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데, 그중 상용어(working language)로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주로 씁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직원이 한국인인 대표부 내에서는 한국어를 쓰고, 유네스코 본부 및 다른 회원국과 연락할 때는 주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프랑스어를 쓰려고 노력합니다. 불어불문학 복수전공자로서의 자신감일까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지만 사실 저로서도 그건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덕분에 저의 불어 생활은 슬픔이기도, 또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지도 어언 20여 년. 작년 파리 출장 때 식당과 길거리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에도 애를 먹게 했던 저의 쇠락한 불어 실력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저는 고급 수준의 어학 교재 몇 권만 챙겨 파리로 왔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입과 귀가 트이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슬프게도 그 기대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영어도 꽤 잘 통하는 프랑스에서(상점에서 불어로 질문해도 영어로 답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굳이 불어를 쓸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잘 알고 싶어서, 제 인생 마지막 불어 공부라 다짐하며 프랑스어 기초 교재를 사러 서점에 갔습니다.
서점에는 반갑게도 제가 25년 전에 활용했던 교재가 (헌책이지만)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모제 파란책’이라 불리던 『Cours de Langue et de Civilisation Françaises(프랑스 언어와 문명 수업)』라는 책인데요. 1953년에 발간되고 1967년에 개정판이 나온 이 책은 1990년대까지 한국 ‘알리앙스프랑세즈’에서 교재로 사용됐던 역사적인 책입니다. 지금 프랑스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께 추천하기엔 너무 예스러운 교재인데요. 저로선 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뿐만 아니라 우수한 프랑스 ‘문명’을 전파하겠다는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불만이 있었습니다. 특정 국가의 문화적 우수성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시대적 한계가 책에 반영된 듯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문법 설명과 구성은 여전히 훌륭했고, 무엇보다 어학 교재이면서도 마치 소설처럼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점이 매력적입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프랑스 파리로 파견 근무차 오게 된 한 가족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지는데요. 비록 70여 년 전의 가상의 설정이지만, 파리의 ‘외노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 공감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10월부터는 야심차게 두 개의 프랑스어 수업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리 시에서 운영하는 수업으로, 평일 저녁에 초등학교 교실을 빌려서 진행됩니다. 학교 건물인 만큼 출입 시 신분증 검사를 꽤 철저히 합니다. 파리에서 살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학생 20여 명이 참여하며, 최신 교재와 각종 매체 기사, 팟캐스트, 유튜브까지 활용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유네스코 본부에서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수업으로 유네스코 본부, 대표부, 기타 프랑스 소재 유엔기구 직원 및 배우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입니다. 제가 듣는 수업은 1주일에 한 번이라 시간 부담은 덜하지만, 앞서 소개한 파리 시 운영 수업보다 수준이 높아서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그렇지만 수업시간에 유네스코 본부와 다른 대표부의 이야기들을 전해 듣기도 해서 여러모로 유용한 점도 있습니다.
분명 양질의 수업을 듣고 불어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생활인데도 실력이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새로운 단어나 표현은 돌아서면 잊어버리죠(물론 가장 큰 책임은 예습 복습을 열심히 하지 않은 저에게 있습니다). 파견 초기에 본 프랑스 영화 한 편을 최근에 다시 봤는데요. 그때 이해하지 못한 농담의 이미를 이번에도 놓쳤고, 웃음 소리로 가득한 영화관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말만 해야 하는 불완전한 외국어 생활은 어쩌면 제가 파견근무를 마칠 때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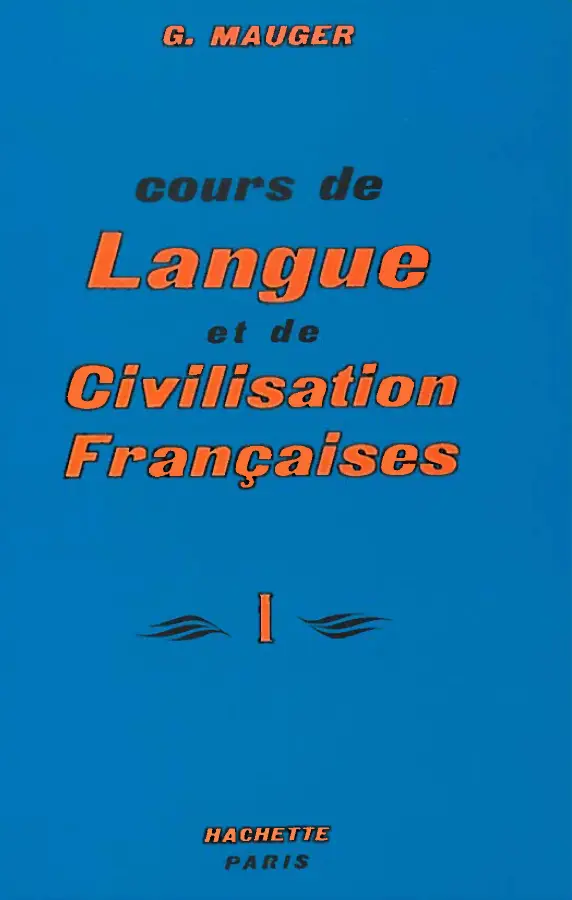
그럼에도 외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랑스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특히 다양한 국가 출신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여러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 좋은 공연이나 책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최근에 추천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서로움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 파리의 외국인이라면 집 구하기와 관련된 슬픈 사연을 저마다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 서툰 외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여유와 너그러움을 갖고 상대방을 말을 경청하게 된다는 점도 외국어 소통의 기쁨입니다. 서로가 최대한의 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재미만으로도 프랑스어 수업을 듣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실력이지만 거리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도와줄 때는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길치인 데다 누가 봐도 동양인인 저에게 불어로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꽤 있어서 저도 신기한데요. 스마트폰 덕분에 그들을 두 번 고생시키지 않고 ‘친절한 현지인’이 되어 길을 곧잘 알려주곤 한답니다.

홍보강 주유네스코 대한민국대표부 주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