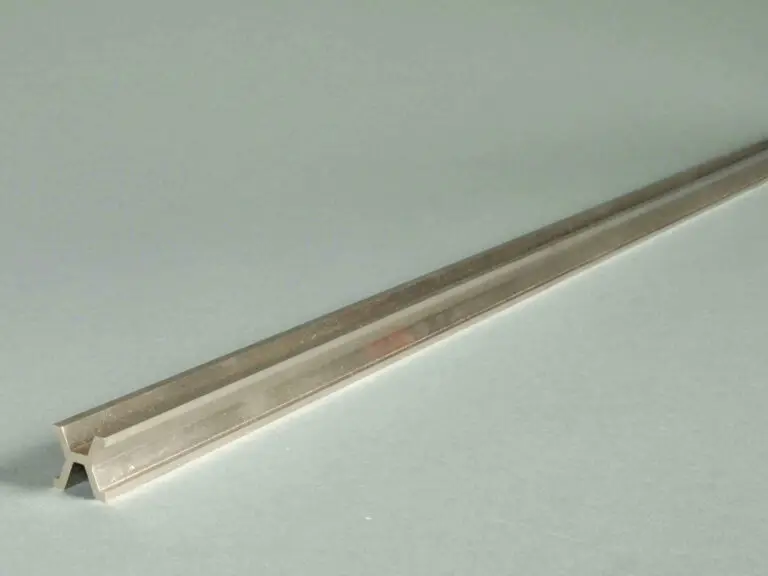1945년 유네스코 창설 당시 유네코(UNECO)에 과학(S)이 뒤늦게 추가되어 유네스코가 된 역사적 배경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의 위력은 미래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있어 과학의 핵심적인 역할을 명징하게 보여줬다. 그 결과, 유엔체제에서 과학을 기관명에 넣은 기구는 지금도 유네스코가 유일하다. 유네스코의 초대 사무총장이던 영국인 줄리언 헉슬리는 생물학자였고 과학 대중화에 앞장섰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과연 유네스코를 완성한 S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있을까?
현재 유네스코의 자연과학 사업은 크게 해양학(IOC), 수문학(IHP), 지질학(IGSP), 기초과학(IBSP), 생물다양성(MAB) 등 5개의 국제 과학프로그램으로, 인문사회과학 사업은 사회변동관리(MOST) 프로그램으로 대표되고 있다. 특히, IOC는 해양학 분야에서 유일한 정부간 위원회이며, MAB는 지난 40여 년간 110여 개국에서 620개가 넘는 생물권보전지역네트워크를 이뤄냈다. 82개 유네스코 카테고리 2 기관 중 40개가 자연과학 분야인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미국 조지타운대 싱(J.P. Singh) 교수는 2010년 발간한 유네스코 연구서에서 유네스코 과학사업이 역사적으로 일관된 논점이나 ‘스토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니셔티브들을 이어붙인 조각보’(patchwork)로 정의한 바 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해 보면, 유네스코의 교육사업은 보편적 기초교육이라는 분명한 양적지표 수치를 유니폼에 새기고 ‘모두를 위한 교육’(EFA)을 최전방 공격수로 내세워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와 공조하고 있다. 문화사업은 문화재와 문화다양성을 위시한 6개 국제협약을 클러스터로 엮어 확고한 규범적 미드필드를 구축하여 최고의 대중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반면, 과학사업은 뛰어난 개인기를 지닌 분야별 프로그램과 정부간 위원회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팀워크 부족으로 각개약진을 하다보니 골 결정력이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의 전략은 차기 사업계획(37C/5) 설계도에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문화와 정보커뮤니케이션을 통합하여 현 5개 사업 섹터를 3개 섹터로 재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제안은 회원국의 이해 관계가 얽힌 복잡한 미로에 갇혀 현재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형국이다. 그래서 교육, 과학, 문화 등 여러 영역이 백화점이 아닌 유기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하이브리드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한편, 유네스코의 S에 대한 또 다른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지속가능성 과학(Sustainability Science)이다. 지속가능성 과학은 ‘분과’별 접근이 아닌 현대 사회의 ‘핵심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과학-정책-사회의 연계와 선순환을 촉진하는 한편, 기존의 순수과학-응용과학, 자연과학-인문사회과학의 틀을 벗어나 학제간 협력과 융합의 ‘스토리’와 담론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속가능성 과학은 일본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후속으로 의제 선점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지난 191차 집행이사회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아직 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유네스코 사업계획(2014-17)에 이를 도입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의견 차를 좁히기 위해 이번 달 19일 유네스코본부에서 지속가능성 과학 유네스코-유엔대학 합동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향후 논의 추이에 따라 차기 유네스코 집행이사회 및 총회에서 ‘지속가능성 과학’의 입지가 결정되겠지만, 이번 논쟁은 오랜만에 유네코에서 유네스코로 명칭이 바뀐 60여년 전의 극적인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강상규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주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