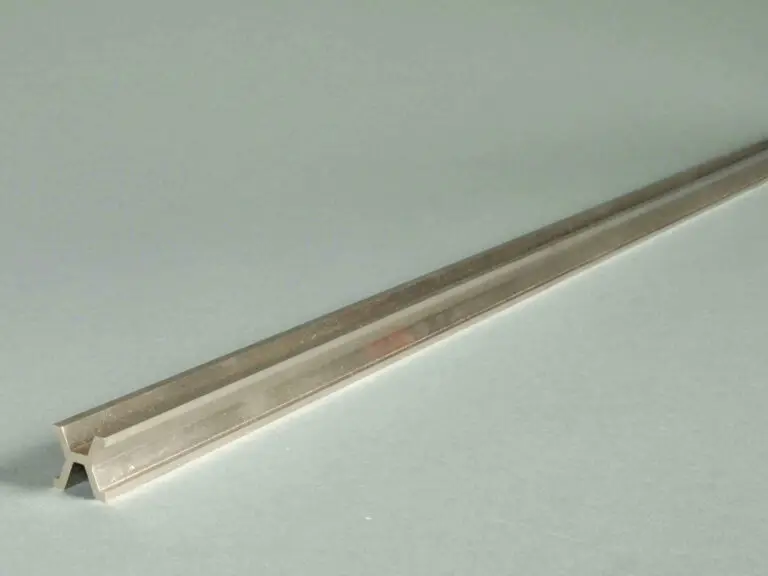전쟁이 잠든 곳에서 피어나는 생명들…
바라메, 추므로, 비추온. 외국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한글로 옮겨 놓은 것도 아니고, 미취학 아동이 누군가 불러준 것을 맞춤법에 구애받지 않고 받아적은 것도 아니다. 귀엽게 형상화한 세 마리 물범 이름이다. 이 물범들은 인천에서 열리는 제17회 아시안 게임의 마스코트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물범을 아시안 게임 마스코트로 정한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에서는 백령도 해역이 대표적인 서식지인 물범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 아니던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격히 감소하거나 소수만 남아 있어 가까운 장래에 절명될 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생물을 일컫는다. 이들은 법으로 지정해 보호·관리하는데, 현재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는 검독수리, 늑대, 죽백란 등 51종, 2급으로는 가시고기, 구렁이, 조롱이 등 196종이 각각 지정돼 있다.
DMZ 일원은 생태계가 우수해서 이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피난처로 불리기도 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이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위급종’에 해당하는 사향노루는 이제 비무장지대 일원이 아니면 그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 1400마리밖에 없는 세계적 멸종위기 조류인 저어새가 한강 하구의 섬들에서 번식하고 있고, 두루미는 전 세계 2500마리 가운데 약 1000마리가 DMZ 일원에서 겨울을 보낸다. 그밖에 수달, 삵, 산양, 어름치, 열목이, 황쏘가리, 금개구리, 남생이, 까지살모사, 붉은점모시나비 등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DMZ 일원에서 서식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정전상태가 60년 이상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중무장한 병력이 배치된 데다,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고, 곳곳에 매설된 지뢰 때문에 통행이 금지된 탓에 자연이 자기이름(自然)처럼 스스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공간을 다시 만들어낸 것이다.
이제는 이처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의 보금자리가 된 DMZ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를 둘러싸고 DMZ 일원의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DMZ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민통선 지역 중 아직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곳을 국내법상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나아가 국제적인 보호지역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중 하나가 민통선 지역 주민들이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DMZ 일원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
신종범 과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