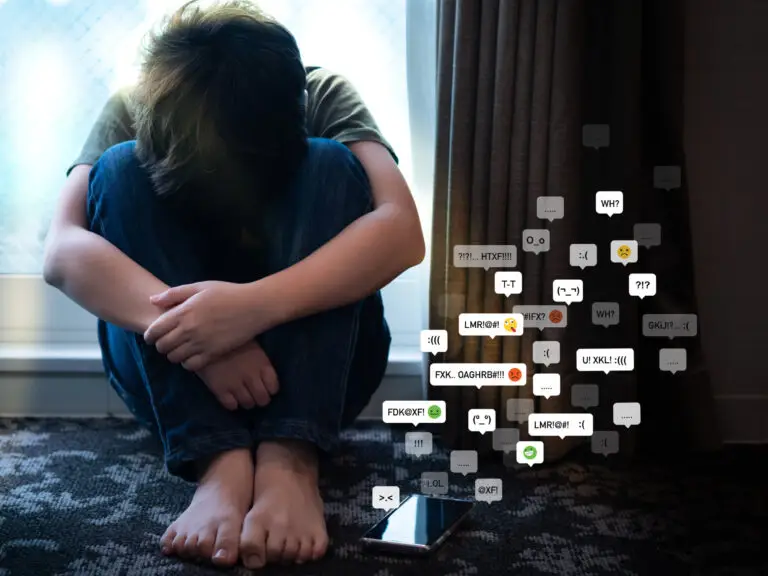[유네스코 타임머신 / 그땐 이런 일도] 한위 60년 뒤안길 들여다보기 I
외국인에게 이 책을 읽히자!
| 올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위)가 설립된 지 60돌을 맞는 해이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민적 여망을 안고 탄생한 유네스코한위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교육·과학·문화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왔다. |

1960년대 중후반 해외의 역사 오류로 인해 국내 사학계가 들끓은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일본이 아니라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센터에서 발행한 <한국소사> 때문이었다. 1963년에 나온 이 책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식민사관으로 펴낸 <한국사 입문>(1925년), <조선사 지침>(1937년) 등을 토대로 우리 역사를 서술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왜곡과 오류투성이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학계가 비판에 나섰던 것이다.
당시 실태를 파악한 유네스코한위는 당대의 사학자인 이선근, 홍이섭 박사에게 <한국소사>의 잘못을 지적하는 서평 원고를 의뢰했다. 나중에 이 원고를 번역, 유네스코 본부 및 동서문화센터에 보내 바로잡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맞물려 ‘정확한 한국사를 해외에 알려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최초의 영문판 <한국사>가 탄생 배경도 결코 이 일과 무관하지 않았다.
1969년 유네스코한위는 유네스코 본부와 문교부의 후원으로 영문판 <한국사> 제작에 착수한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작비용은 약 400만 원. 금 1그램이 760원 하던 시절이었으니, 요즘 화폐가치로 보면 2억원을 약간 웃도는 예산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였다.
필진의 면면도 화려했다. 사학의 태두인 서울대 김철준 교수, 손보기·홍이섭 연세대 교수가 각각 전담 분야를 나눠 집필했다. 광복 이후 국내 사학자들이 20여 년간 연구한 결과가 하나로 녹아 담긴 역작이었다. 특히 공주의 고대유적에서 3만 년 전의 문화층이 확인된 것을 계기로 처음으로 한국사의 시작을 후기구석기시대로 연장해 기술한 점도 눈에 띄었다.
이듬해엔 1년여의 산고 끝에 영문판 <한국사>가 ‘The HISTORY of KOREA’ 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왔다 . 외국 학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최초의 영문 역사책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행한 400쪽짜리 는 해외공관 등을 통해 외국에 배포되었고, 일부는 국내에서 판매됐다. 1970년 11월 14일자 <동아일보> 3면 하단에는 ‘외국인에게 이 책을 읽히자!’란 제목의 책 광고가 실리기도 했다. ‘식민사관에서 탈피한 민족적 역저이니 외국인에게 이 책을 읽게 해 한국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시키자’는 내용이었다.
관련기사
————-
– 일본 심장부에서 역사 왜곡에 첫 ‘회초리’ 56년 유네스코 아시아지역회의서 ‘바로잡기’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