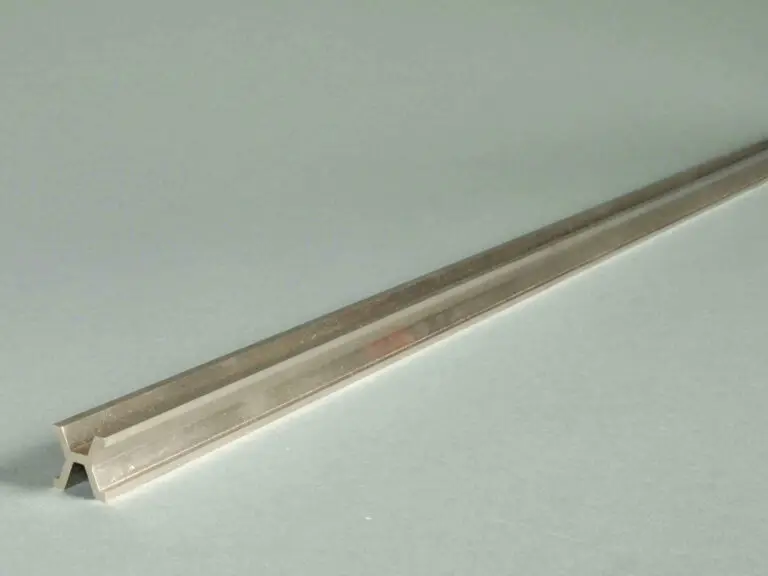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741호] 커버스토리
매 해 연초는 대중문화계의 시상식 시즌이다. 시상식 참가자들이 선보이는 패션은 동시대 전세계가 주목하는 트렌드가 된다.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골든글로브(Golden Globe)와 그래미(Grammy)부터 3월의 아카데미(Academy)까지,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아티스트들이 올 시상식에서 선보일 ‘베스트 액세서리’로 ‘정치적 발언’을 꼽았다. 여성 아티스트들은 더는 시상식의 꽃으로 남기를 원하지 않는다. 시상대에 오른 여성들은 하나같이 검정 드레스, 혹은 흰 장미를 내보이며 기쁨 대신 각오를, 꿈 대신 연대를 외친다. 1월 7일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최초로 평생공로상(세실 B. 드밀 상)을 받은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다.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말하는 새 시대란 어떤 것일까. 진정한 성평등(gender equality)이 이루어진 세상일까. 만약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혹은 남성들이) 법적·제도적으로 충분히 평등해지지 않았느냐고 반문하는 지금, 세상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는 것일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SNS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은 불과 몇 개 월 만에 세상을 휩쓸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터져 나온 “나도 피해자다”라는 외침은 실리콘밸리에서, 워싱턴 정가에서, 그리고 바다 건너 대한민국에서 끝없는 메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나 역시 그런 일을 당했기에)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미국의 사회활동가 타라나 버크(Tarana Burke)가 2006년 처음 내건 슬로건에서 시작됐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지난해 10월 미국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의 한줄 트윗이었다. 알리사 밀라노는 “(모두가 자신이 당한 성폭력 혹은 성희롱 사실을 공개하면) 사람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을 것”(give people a sense of the magnitude of the problem)이라 썼다. 불과 며칠 후, 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여성의 수는 수백만 명이 넘었다. 대폭발이었다. 그리고 미투 운동은 성폭력 근절뿐만 아니라 평등한 사회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연대를 상징하는 들불이 됐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가해자도 많아지고 있다. 유명 콘텐츠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이 상징적인 사례다. 헐리우드 최고 거물로 꼽히는 하비 와인스틴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성 추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하지만 배우들의 영화나 방송 출연 경로를 꽉 틀어쥔 채 결백을 주장하는 그의 영향력 앞에서 피해자는 끝까지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업계 동료들이 피해자와 연대를 모색하기는 더 어려웠다. 그 철통 같던 벽을 미투 운동이 허물었다. 여배우 로즈 맥고완은 1997년에 하비 와인스틴으로부터 당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침묵의 대가로 합의금을 던져주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커리어를 망쳐버리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하비 와인스틴의 전형적 방식이라는 소문이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다. 로즈 맥고완에 이어 애슐리 저드, 안젤리나 졸리 등 세계적 톱스타까지 피해자였음을 밝히면서 와인스틴이 만든 콘텐츠의 보이콧 선언도 이어졌다. 결국 와인스틴은 자신이 설립한 거대 제작사 와인스틴 컴퍼니에서 해고당했고,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는 그를 영구 제명했다.

침묵을 깬 사람들
하비 와인스틴은 여전히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폭로를 기사화한 <뉴욕타임스> 등 유수 언론에 다각도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하비 와인스틴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쥔 가해자들이 온갖 추문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는 지난날의 상황과 비교할 때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피해자가 더 이상 소수의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의 일관된 목소리라는 사실이다. 권력자가 ‘원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거나 ‘먼저 유혹했다’는 따위의 꼬리표를 한 집단 전체에 덧씌우기 힘들어졌다는 뜻이다. 헐리우드를 떠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들이 폭로 행진에 앞다퉈 동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 동안 피해자를 향한 대중의 손가락질이 피해 여성들을 얼마나 옥죄어 왔는지도 보여준다. 이처럼 연대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심어준 미투운동은 우리나라에서 서지현 검사와 최영미 시인의 폭로로 이어졌다. 이들의 용기 덕에 사정기관과 문화예술계 내 최고 권력이 형성한 침묵의 카르텔도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세계적 시사주간지 <타임> 역시 2017년 올해의 인물(Portrait of the Year)로 ‘침묵을 깬 사람들’(silence breakers)을 선정하고, 이러한 목소리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왜 안 싸워? 그럼 뭘 할 건데?”(Why not fight back? What else are we doing?)라는 로즈 맥고완의 말을 덧붙였다.

여성만이 아닌 ‘우리’의 연대
개별 행위에 대한 폭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응원으로 이어지는 미투 운동의 종착지가 가해자 처벌에 그친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처벌은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다. 하나된 목소리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바는 진정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당장 바꿔야 할 것을 함께 고민하고 행동에 옮기자는 약속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남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유엔여성기구의 성평등 캠페인 ‘히포시’(HeForShe) 홍보대사로 임명된 여배우 엠마 왓슨은 유엔본부에서 “세상의 반쪽만 참여하는 캠페인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는가”라며 더 많은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성평등 활동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폭력방지단체 ‘어콜투맨’(A Call To Men), 성폭력 생존자 지원단체 ‘조이풀 하트 재단’(Joyful Heart Foundation) 등 여러 국제 단체들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남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마일레 잠부토 조이풀 하트 재단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문제”라며 “미투 운동을 이어받아 다른 남성들에게 맞서고 목소리를 내고 도전하고 책임을 묻는 용감한 남성들이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보이지 않는 성차별을 철폐하고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과 남녀에 대한 뿌리깊은 고정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가해자들의 구차한 변명에서 볼 수 있듯, 그리고 ‘다른 의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며 불편함을 표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응에서 볼 수 있듯, 현재 우리 사회 저변에는 성과 관련해 잘못을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는 지난 2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미투 운동에 대한 단상을 전하며 “‘남성만이 가는 군대’가 사회 문화를 여전히 지배하는 한국에서 (중략) 남성과 여성은 애당초부터 전혀 다르게 인식되고 대접받는다”고 했다. 더불어 “젠더(gender)적 구분 짓기, 젠더 차별이야말로 이 사회가 움직이는 기본적 매커니즘”이라며 “여성주의적 시각과 입장은 모든 운동들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안의 ‘괴물’을 잡자
“괴물을 키운 뒤에 어떻게 / 괴물을 잡아야 하나.”
문화계간지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실린 최영미 시인의 시 ‘괴물’의 끝부분이다. 문단 내 성폭력을 신랄하게 고발한 이 시의 내용처럼, 잘못을 잘못이라 인식하지 못하면서 자라버린 성인이 뒤늦게 이를 뉘우치고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교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기현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순결이나 금욕 위주의 기존 성교육은 성차별적 관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라며 “성교육은 자신을 잘 조절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는 것, 즉 평등과 존중 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물학적인 성만을 다뤘던 기존의 성(sex, 섹스)교육에서 벗어나, 인권과 성평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성(sexuality, 섹슈얼리티)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네스코 역시 지난 2009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여성기구 등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 CSE)을 시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올1월 펴낸 <성교육 국제 실무 안내서>(International Technical Guidance on Sexuality Education) 개정판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이란 “경험적, 감정적, 육체적, 사회적 맥락에서의 성(sexuality)교육”을 말한다. 성교육의 목표 역시 청소년이 향후 타인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한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있다. 오드리 아줄레 유네스코사무총장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인권과 성평등의 측면에서 성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이번 안내서가) 증명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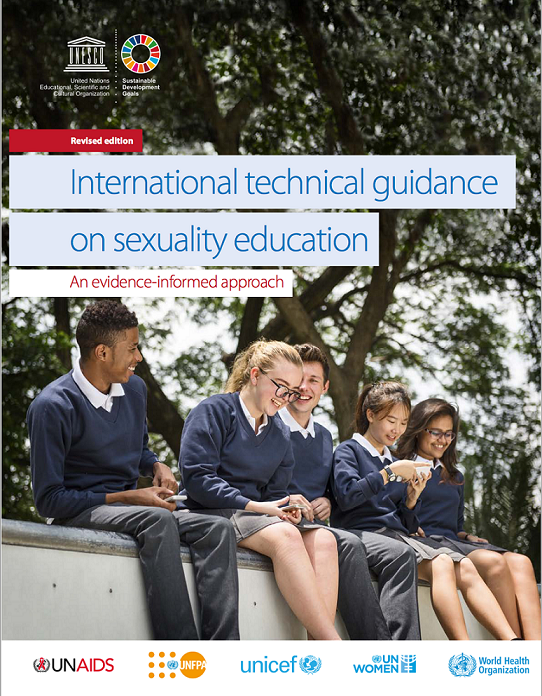
익숙한 것과 작별할 때
포괄적 성교육에 포함된 ‘평등과 다양성에 기반한 관계 맺음’의 가치는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요한 토대 중 하나다. 환경오염, 빈곤, 차별 등 인류가 직면한 모든 문제가 다름아닌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환경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하고 평등한 관계에 기반한 성교육이 성평등만을 위한 열쇠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열쇠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은실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 ‘디지털시대 우리를 물들인 차별과 혐오의 성문화, 교육의 역할을 찾다’에서 성평등과 권리교육이 결합한 성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언급하며 “이를 보장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민주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교육의 힘을 빌어 과감히 익숙함과의 작별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그 익숙함이란 다름 아닌 남녀 역할이나 남녀 관계에 대한 우리의 오랜 편견이다. 수천 년간 굳어진 편견이 사회 어디에나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편견이 폭력과 혐오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러움’이 누군가의 ‘불편함’임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새 시대를 향해 함께(with you) 나가자고 당당하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김보람 <유네스코뉴스> 편집국장
참고자료
blog.hani.co.kr “‘Me too 미투’ 운동을 보면서 ‘한국과의 만남’을 회상한다”
bbc.com “미투 운동: 한국에선 왜 이제야 본격화 됐나?”(한국어 기사), “Hillary Clinton: Nominated for president, but not for the front page”
chicagotribune.com “In wake of MeToo movement, sex education evolves”
theguardian.com “White roses and black velvet: the Grammys red carpet”
hani.co.kr “올바른 성교육이란?”
hrw.org “South Korea Backslides on Sex Education”
nytimes.com “The Reckoning: Teaching About the MeToo Moment and Sexual Harassment With Resources From The New York Times”
unesco.org “UN urges Comprehensive Approach to Sexuality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