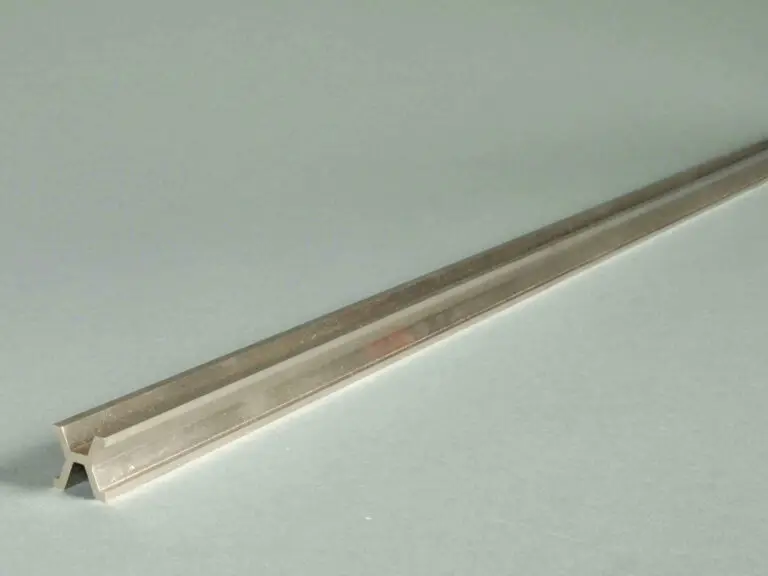할아버지와 손자,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수평적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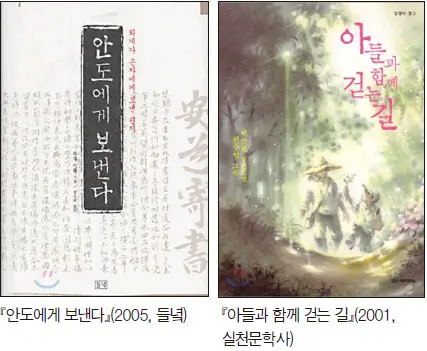
젊은 할아버지 퇴계는 서거하기 한 달여전까지 장손자 안도에게 편지를 보냈다. 마지막 편지는 손자보다 마흔 살 많은 퇴계가 병석에 눕기 이틀 전에 쓴 것이다. 편지 대부분을 손자의 안부를 묻는 데서 시작하는 퇴계는 인근 지역에서 전해진 과거시험 합격자 명단에 손자 이름이 들어가 있음을 보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른다. 또 손자가 무사히 서울에 돌아가고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에도 기뻐하고, 외딴 곳의 거처를 얻거나 성균관에 들어가 책읽기에 열심인 손자 소식을 듣고서 자신의 일처럼 반가워한다.
하지만, “너는 요즈음 하릴 없이 분주하기만 한데, 어째서 마음을 다잡고 공부하지 않는 것이냐”(43쪽)며 나무라기도 하고, 손자가 모르는 것을 알려는 뜻은 없고 오로지 과거시험에 합격해 벼슬자리를 얻는 데만 마음을 두고 있다고 느낀 탓인지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퇴계가 65세, 손자인 안도가 25세 때의 일이다.
퇴계 이황이 자신의 손자에게 보내는 125통의 편지를 묶은 『안도에게 보낸다』라는 책 이야기다. 아들은 자신의 기대에 못 미쳐서 일까, 아니면 손자도 자신과 같은 인물이길 바라서일까, 손자가 생물학적 후손의 의미를 넘어 가문을 이어가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손자 안도에 대한 퇴계의 애정과 관심은 각별하다.
그렇다고 해서 퇴계는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를 권위와 순응 또는 명령과 이행의 관계로 못박지 않는다. 퇴계는 편지에서 손자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옆에 두고 일일이 그 이행상태를 점검만 하는 게 아니다. 할아버지인 퇴계도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나 마음의 상태도 솔직하게 그러나 대나무 마디 같은 절제된 방식으로 드러냄으로써 손자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퇴계는 자신이 출사하지 않은 이유, 자신이 도산의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지 못하도록 설득한 이유를 편지를 통해 매우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상하되 무책임하지 않는, 단호하되 일방적이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근사한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지는 셈이다.
거유(巨儒)가 손자와 주고받은 편지를 읽기가 다소 부담스럽다면, 작가 이순원이 작중 화자가 되어 아들과 함께 대관령 길을 넘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은 어떨까 싶다. 이 책은 묘하다. 처한 상황에 따라 읽는 사람은 아들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아들이 아니라 딸이어도 상관없다. 책을 보면 금세 알게 되지만, 작가에게 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성이 아니다.) 나 역시 이 책을 읽는 동안 아버지가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를 되풀이했다.
30여년 전에는 아들 입장에서 선친과 함께 길을 걸었다. 나와 함께 동네를 한바퀴 도는 것을 좋아하셨던선친은 당시 집집마다 대문 위에 붙은 문패를 가리키며 내게 한자를 가르쳐 주셨다. 이따금 목욕탕에도 데려가셨다. 그런데 당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철부지 아들과 함께 걸으면서 선친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다. 혹시 너무나 일찍 돌아가신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조부와 함께 걷는 길을 떠올리지 않으셨을까?
지금은 아버지 입장에서 작중 화자의 아들과 나이가 비슷한 딸과 걷는다. 가벼운 운동 삼아, 산책 삼아, 나들이 삼아 딸과 걷는다. 딸아이 학교 얘기도 하고 아빠의 출근 길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얘기를 나누는 동안 책 내용 중 “아까는 그쪽에 섰다가 이번에는 이쪽에 선다”(173쪽)는 구절을 떠올린다. 나는 이 구절을 “아까는 내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다”로 번역한다.
퇴계가 손자에게 보낸 편지가 격조와 무게를 잃지 않는 것도 생각해보면 “자신의 얘기를 말하기”와 “상대방 얘기 듣기” 간에 아주 적절하게 조화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로 인해 할아버지 퇴계와 손자 안도 사이가 더욱 도타워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 함께 읽어볼 만한 책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지음, 박석무 옮김, 창비 2010년) 1803년. 정약용은 유배지 강진에서 맞은 두 번째 새해 아침, 두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신이 일러 준 경전에 대해 일체의 질문도 없고, 역사에 대해 아무런 주장이 없는 두 아들을 향해, 들리지는 않지만 천둥 같은 목소리를 죽비삼아 내리친다. “어째서 스스로 포기하려 하느냐? 영원히 폐족으로 지낼 셈이냐?” 따지고 보면 정약용은 자신을 향한 염려와 위로가 필요한 귀양살이 신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보다는 오히려 유배 중인 자신 때문에 두 아들이 기가 죽고 위축되어 살아갈까 걱정한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힐링을 간절히 필요로 했던 정약용. 그는 자신의 상처를 자신은 결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을 통해 다스린다. 정약용식 마음상처 치료법이라고 할까? |
신종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과학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