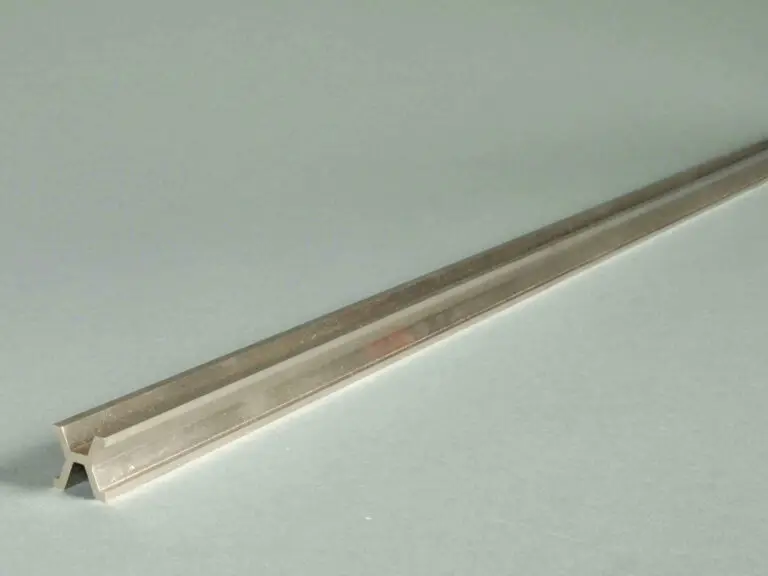반기문 사무총장이 1년 전 유네스코를 방문하여 기증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자연 교과서는 지금도 유네스코 본부 1층에 전시되어 있다. 당시 반 총장은 1956년에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인쇄된 교과서로 공부하던 어린이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었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알리산드라 커밍스 집행이사회 의장은 유엔체제 내 유네스코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반 총장에게 “유네스코는 개발기구가 아닌 인류의 지적, 윤리적, 도덕적 지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네스코는 개발기구가 아니다. 1945년 채택된 유네스코 헌장에는 개발(development)이라는 단어가 두차례 등장하나 ‘개발기구’의 기능과는 무관한 용례로 쓰였다. 보코바 총장을 포함하여 전현직 유네스코 사무총장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네스코의 숭고한 사명, 타 유엔기구와의 차별성을 언급하면서 늘 개발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네스코는 점점 개발과 연계되는 맥락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며, 오히려 ‘개발’과 가치적 거리를 좁혀가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첫째, 유네스코는 투자 대비 효과, 즉 원조 효과성 제고를 요구하는 주요 회원국의 평가에 직면하고 있다. 2011년 영국의 다자원조평가(Multilateral Aid Review)를 필두로 호주, 스웨덴, 미국 등이 ‘개발기구’의 잣대로 유네스코의 기관 역량과 사업 성과를 산정하기 시작했다. 각국은 이러한 평가를 공개하여 유네스코 개혁 의제에 대한 방향성과 주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세금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국제기구에 ‘까다로운 고객’의 면모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유네스코는 유엔체제 내 개발그룹(development group)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개발 이슈에 이미 밀접하게 개입되어 있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하는 유네스코의 ODA 계수도 과거 25% 수준에서 2008년 44%, 2013년에는 60%로 꾸준히 상향 조정되어 유네스코 사업의 개발 기여도 및 연관성을 구체적인 수치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유네스코가 야심차게 도입한 성과기반예산(RBB)은 앞으로 유네스코의 개발과의 연계를 증폭하는 또다른 기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유엔 기구들의 최상위 근거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과학, 문화 등 전통적인 ‘비개발’ 영역도 개발목표라는 틀 속에서 가치를 부여하거나 해석하게 되었다. 모두를 위한 교육(EFA)은 이미 MDG와 동조화되어 있고, 문화와 발전 이슈는 유네스코 주도로 금년 유엔총회 의제로 상정되어 있다. 유엔 기구 간 경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네스코 의제가 국제 개발 이슈와 밀접해지면서 Post-2015 개발목표 설정에 유네스코 사업 영역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은 당연시 되고 있다.
요컨대, 옳고 그름을 떠나 유네스코의 정체성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이미 ‘개발기구’적 성격을 폭넓게 포용하기 시작했다. 4년 주기로 개편된 첫 사업계획(2014-17)을 받게 될 차기 사무총장의 가장 시급한 임무는 재정위기 극복이 아니라, 현실적인 비전으로 기관 정체성(institutional identity)을 새로 정의해 나가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유네스코 본부 1층에 전시된 자연 교과서는 대한민국의 과거이자 유네스코의 미래이다.
강상규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주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