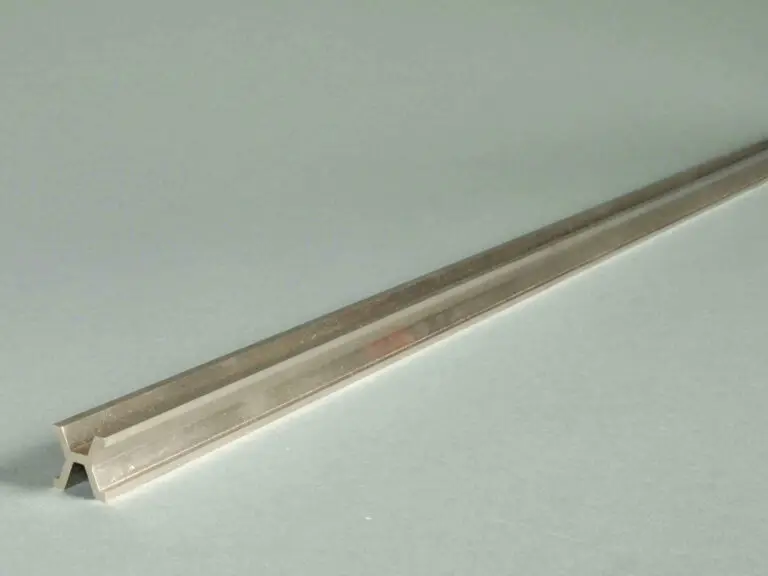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책 / 冊 / BOOK]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학에서 나온 ‘지구’나 ‘환경’이라는 낱말에 매우 익숙하다. 그리고 ‘환경 윤리’라는 용어도 별다른 성찰 없이 쓰고 있다. 그런데 이 ‘환경’은 윤리를 논하기에 적합한 말이 아니라는 지적을 한 사람이 있다. 프랑스의 환경 철학자 오귀스탱 베르크이다. 그는 『대지에서 인간으로 산다는 것』(ˆEtre humains sur la terre)라는 책에서 ‘환경’보다는 ‘에쿠멘’(´ecum ´ene)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에쿠멘’은 ‘사람이 사는 땅’을 의미하며 ‘주거지’,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oikos)에서 유래한 것이다. 생태학(ecology)이나 경제학(economy)과도 그 뿌리가 같다. 과거에는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만을 에쿠멘이라 했으나 인류가 지구표면을 모두 정복해버려 이제 지구 자체가 에쿠멘이 되어버렸다. 지구라는 말은 원래 단순히 물리적 물체, 혹은 생태학적 실체를 말할 뿐이지만 에쿠멘으로서의 지구는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우리의 존재 장소로서의 지구를 의미한다.

왜 베르크는 이러한 구분을 하려했을까? 지구나 생태계, 환경은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의 삶터로서 보았을 때만이 의미와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과학혁명 이후 사람들은 과학적인 용어에 익숙해져 의미와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인문학적인 용어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지리학은 땅을 광물이나 무생물로 취급하고 땅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이 땅을 이용하는 관계이다. 한편 풍수는 땅이 능동적인 것으로서 만물을 낳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서양에도 동양의 풍수와 유사하게 장소의 신비로운 힘을 의미하는 제니우스 로치(genius loci) 같은 개념이 있었고 그것은 에쿠멘적인 의미를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사는 땅은 의미와 상징으로 가득한 세계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사물의 이치를 배우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사랑하며 시적으로 산다.
그래서 사람과 에쿠멘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이 풍경과 정원이다. 환경은 과학적인 용어이지만 풍경은 인문학적인 용어이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좋아하며 그러한 풍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원이다.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는 대지(우리의 지구, 풍경, 집)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만 한다. 그것이 에쿠멘의 필요성이다. 세계를 뜻하는 불어 몽드(monde)는 형용사로는 깨끗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리스어 코스모스(kosmos)는 질서를 의미함과 동시에 우주(cosmos)를 뜻하는데 아름다움과 관련된 코스메틱(cosm ´etique: 미용법)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다. 우리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에쿠멘 (인간적 거처)으로서 지구를 존재론적으로 원하며 그것이 환경 윤리(에쿠멘의 윤리)의 근거가 된다. 에쿠멘의 차원을 떠나 단지 생물권 개념만으로는 윤리를 설정할 수가 없다. 사람이 없이 다른 생물들만 사는 지구는 윤리를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갈릴레이는 “지구는 돈다”라고 하여 과학의 시대를 열었지만, 현상학자 훗설은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해 인간의 실존적 인식의 특성을 말했다. 과학은 객관성을 내세워 인간의 탐욕을 은폐하기도 하지만 에쿠멘의 윤리는 인간의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구환경을 아름답게 보전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Man and Biosphere Programm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도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가 중요시된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생물권 보전지역도 인간의 삶터(에쿠멘)를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안으로서 존재 근거가 있는 것이다.
| <책속으로> “사실 행성이나 생물권으로서의 지구와 에쿠멘으로서의 지구의 차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에게 지구는 생물권 안의 다른 모든 생물체처럼 단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환경이 아니다. 에쿠멘인 지구는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조건이다. 만일 그런 에쿠멘이 없다면 인간도 다른 동물과 하등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만일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없고 환경에 완전히 좌우된다면 악도 없고 선도 없을 것이며, 오직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만 있을 뿐이요, 생태계와 생물권의 먹이사슬로만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 생명과 생태학적 체계를 넘어서고, 그리하여 윤리적 삶의 영역에까지 이르고자 한다.”(pp. 13-15) |
김승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