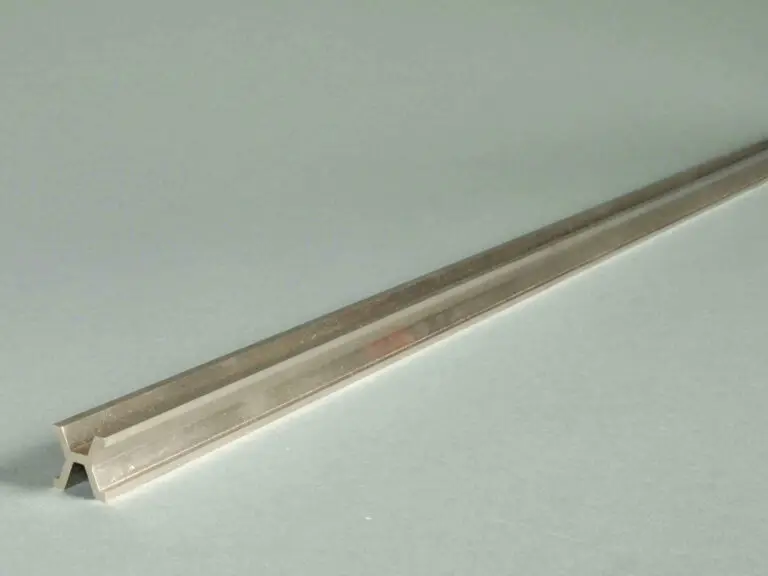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유네스코 타임머신 / 그땐 이런 일도] 한위 60년 뒤안길 들여다보기 II
| 올해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위)가 설립된 지 60돌을 맞는 해이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국민적 여망을 안고 탄생한 유네스코한위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교육·과학·문화 활동을 펼치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해왔다. 1991년 유엔 가입 이전까지는 한위가 세계로 통하는 ‘한국의 창’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60년, 역사의 뒤안길에 새겨진 한위의 발자취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
우리도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올 수 있었을까
한국문학 번역출간 위한 ‘신탁기금’ 뒷이야기
유네스코 본부는 1960년대에 국제문화 교류를 위해 ‘소수언어 민족의 문학작품 번역계획’에 착수한다. 연간 약 7만 6000달러의 자체 예산으로 해당 국가들 문학작품의 번역비용을 지원하고 출판사를 알선해주는 사업이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도 1970년대 들어 유네스코 본부의 지원을 받아 고전과 단편소설, 시집 등 우리나라 문학작품들을 영어 불어 등으로 번역 출간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불어번역판 <한국시(詩)선집>, 영어번역판 <한국단편소설선집>, <춘향전>, <한국시 조선> 등이 그 대상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 시절 유네스코한위가 우리 문학작품을 번역해 세계에 알리고 각국과 문화교류를 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훈련된 번역자가 부족했고, 번역대상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기구인 번역 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탓이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유네스코 본부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웠고, 유네스코한위의 자체 예산 역시 빈약한 상황이었다. 몇몇 작품의 번역판이 해외에서 출간되기까지 한위 관계자들이 본부 담당자들을 상대로 기울인 노력은 눈물겨운 것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문학에 호의적이던 유네스코 본부 담당자들이 한국 작품의 해외출판을 촉진하기 위해서 권유한 방안은 ‘신탁기금’이었다. 신탁기금이란 일정한 목표와 대상에만 국한된 특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 유네스코에 기부하는 기금이다. 즉, ‘한국작품 번역에만 쓰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신탁기금을 기부하면 유네스코를 활용해 훨씬 폭넓게 한국문학을 해외에 알릴 수 있을 것’이란 얘기였다.
그러나 유네스코한위의 가난한 재정 상태로는 신탁 기금이란 그림의 떡이었다. 이 무렵 이웃나라 일본의 모습은 초라했던 우리의 자화상과는 사뭇 다른 것이었다. 일본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매년 3000달러 이상 유네스코에 신탁기금을 내놓아 많은 자국의 문학작품을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 출간하고 있었다. 1968년 일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장편소설 <설국>도 이러한 번역계획의 하나로 일찌감치 해외에 소개됐었다.
<매일경제>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한위를 통해 문학번역기금을 유네스코에 신탁한 것은 1974년 6월. 일본보다 십수년 뒤늦은 출발이었다.
당시 유네스코한위는 문예중흥 5개년계획의 하나로 문예진흥기금에서 800만 원을 지원받아 유네스코에 한국문학 번역기금 2만 달러를 신탁했다. 유네스코 본부는 이 신탁기금에 기여금 2만 달러를 합쳐 모두 4만 달러의 예산으로 한국문학작품의 번역 지원, 출판사 보조 등의 활동을 폈다. 이 기금을 통해 향후 10년 간에 걸쳐 영문 15종, 불문 5종 등 20여 권의 한국문학집이 해외출판사를 통해 출간되기도 했다.
노벨문학상이 문학작품과 작가의 예술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네스코 신탁기금에 얽힌 뒷이야기는 한 가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만약 우리나라도 신탁기금을 통해 문학적 가치가 높고 향기가 깊은 작품들을 일찌감치 해외에 소개했다면 오래전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