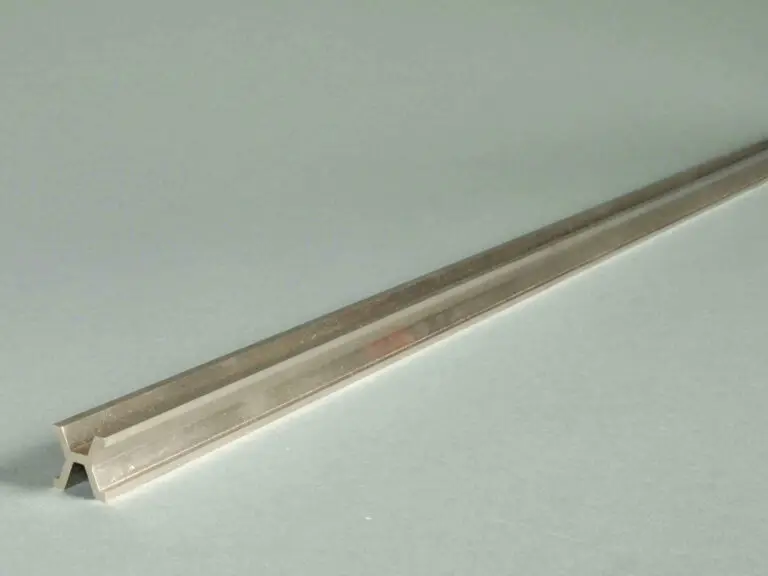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높디 높은 탑 위에서 지금, 행복한가요?”
| 한국전쟁 와중에 부산 수영공항을 통해 홀로 한국을 떠난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미국에서 공부해 한국으로 돌아왔고, 인문학자가 되어 부산 센텀시티에서 열린 세계인문학포럼 연단에 섰다. 공교롭게도 그곳은 60년 전 소년을 태운 비행기가 이륙하던 바로 그 자리였다. 철부지 소년이 조국과 기약 없는 이별을 했던 회한의 장소는 이제 한국의 경제적 기적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어 있었다. 그 누구보다 감회에 젖어 좌중을 둘러보았을 그 소년, 아니 그 학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16대 사무총장을 지낸 김여수 경희대 교수다. 기적처럼 변모한 한국의 60년을 지켜본 증인이자 사회의 건강한 치유를 고민하는 인문학자로서, 그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치유의 방법을 묻는다. 이번에 책으로 발간된 그간의 세계인문학포럼 내용 중, 때론 감동적이고 때론 명쾌했던 그의 글을 발췌, 요약했다. |
센텀시티의 ‘기적’
정확히 60년 전, 48시간에 걸친 여행끝에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그리고 이틀 만에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건물들은 상상 이상으로 높고, 깨끗한 거리는 자동차로 가득했다. 말끔하게 차려 입은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어리둥절해하는 동양의 소년에게 인사를 건넸다.
모든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아 보였다. 당시 나는 이 새로운 세계, 이 새로운 문명은 결코 나의 세계가 될 수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해 배워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결심도 했다.
잔혹한 전쟁이 불완전한 휴전으로 종결된 1953년으로부터 반세기가 훌쩍 지난 오늘, 부산은 크게 변모했다. 이곳은 세계에서 화물 톤수로 5번째로 붐비는 항구 도시이자 수많은 국제 행사들과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가 열리는 곳이다.
휘황찬란한 센텀시티의 모습은 60년 전 수영공항을 떠났던 한 소년으로선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창조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곳에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가난과 경멸이 주는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치유’된 것일까? 센텀시티의 기적은, 한국인들에게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주었을까?

기적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
이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나는 우회적으로 찾아보았다. 지난 대선에서 야당의 후보는 자신이 ‘힐링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고 여당 역시 ‘5천만행복본부’를 발족시켰다. TV에서는 유명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마지막에 마술과 같이 스스로 ‘치유’되었다고 선언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힐링캠프>가 인기다. 그렇게 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힐링’으로 넘쳐나고 있다.
힐링에 대한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과 사회적 유행으로 보아, 조금 전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히 “아니오”인 것으로 보인다. 센텀시티의 기적은 행복과 성취감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론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2006년 ‘삶에 대한 만족 지수’(Satisfaction with Life Index) 조사에서 한국의 순위는 102위에 불과했다. UN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기대수명, 교육, 소득에 대한 종합지수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에서도 한국은 35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철학자 김성진은 한국이 ‘치유의 나라’가 되어 가는 중이라고 정의 내리며 “사람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사회적 환경에 맞춰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려 노력하는 가운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신경증적 증후군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문학, 무엇을 치유할 것인가
이러한 현실에서 철학과 인문학은 한국인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의 하나로 대중들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들은 소크라테스와 공자, 헤세와 법정 스님에 대해 공부하고, 마이클 샌델의 저서<정의란 무엇인가>는 100만 권 이상이 팔렸다. 물론, 놀랄 만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인문학에 대한 수요는 그 뒤에 숨은 노련한 상업주의적 요소 때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이 마음으로부터 철학과 인문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철학과 인문학이 ‘힐링’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고 있다면, 이들 인문학과 철학이 치유해야 하는 고통과 아픔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처음으로 서구 문명을 접할 당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876년 일본과의 강압적 조약으로 서구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한국인은 사실상 문화적으로 백지 상태가 되었고, 일본의 패망과 함께 들어온 미국인들의 정치·사회·문화적 사상과 제도는 ‘구세주이자 혈맹국 문화’로서 한국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다. (자체적으로 창조해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기성의(ready-made) 것들이 우리 안에서 문화적 종합(cultural synthesis)을 이룬 것이다. 그 이전 500여 년간 우리는 유교적 전통을 바탕으로 우리만의 문화적 종합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왔었지만, ‘압축성장’ 과정에서 지식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문화가 제공하는 자원들을 구별할 필요도, 여유도 없었다. 압축 성장은 차용된 문화적 종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여기서 ‘쇠퇴한 문명의 것’으로 간주되던 사상과 가치에 대해 인문학적 사고를 던질 여지는 전혀 없었다.
서구 사회가 수백 년에 걸쳐 형성한 정체성과 창조의 고통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고,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지금 방향을 잃고 혼돈을 겪고 있다.
창의의 시대 위한 과제
희망적인 징후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차용된 모델을 기반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앞서 나가기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인간에게 있으며, 인간에 대한 탁월한 학문인 인문학에 있다. 인문학은 이제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문화적 종합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더욱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전적 인문학뿐 아니라, 사회과학과 유전학, 인공지능, 나노기술과 같은 자연과학까지도 포함된다. 페르낭 브로델은 이를 ‘인문과학’(lessciences de l’homme)이라 말하며 “그것은 단지 옷감의 바깥 면만이 아닌,실들이 복잡하게 꿰매고 있는 옷 전체와 같은 마음의 단독 모험”이라 비유했다.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요구되는 이러한 모험이야말로 오늘 인문학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도전 과제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