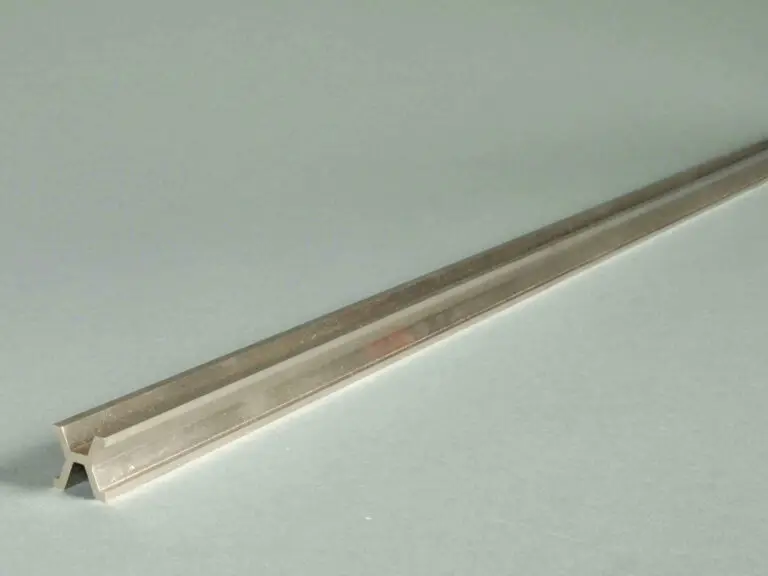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유네스코 총회 분야별 하이라이트: 과학]
2011년 봄 집행이사회부터 시작된 지질공원과 유네스코의 관계 공식화 논의는 이번 총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질공원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1999년 156차 집행이사회에서 처음으로 지질공원 제도를 검토했고 그 후 2001년 161차 집행이사회에서 유네스코의 독립적인 지질공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도 유네스코는 그동안 회원국의 지질공원 활동을 지원해왔다. 즉, 유네스코가 지질공원을 지정하지는 않지만 협력하는 관계를 지속해왔다.
지질유산과 지질다양성을 보전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질공원 제도는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작하여 10여년이 지나면서 여러 국가로 확대되어 지질공원은 현재 29개국 100곳이 활동 중이다. 2011년 186차 집행이사회에 우루과이가 지질공원과 유네스코의 협력강화를 요청하는 안건을 올리면서 이번 총회까지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올해는 특히 집행이사회에서 별도로 워킹그룹을 구성했고, 워킹그룹은 운영지침과 지질공원 공식화 방안(전문가위원회 설치) 등에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전문가위원회 설치안에 대해 사무국은 유네스코에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총회 직전 열린 집행이사회에 보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회원국들은 안건 논의 시에 지질공원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노르웨이, 우루과이,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을 비롯한 다수의 회원국들은 지질공원의 성공적인 활동과 기여를 언급하며 지질공원을 유네스코의 사업으로 공식화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워킹그룹의 활동에 기대를 나타냈다. 지질공원이 없는 회원국들은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유네스코의 지원을 요청했고, 독일, 스위스 등은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유산과 시너지를 기대하기도 했다. 반면 유네스코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재정 부담 문제 등도 지적됐다. 결국 이번 총회도 지질공원 공식화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워킹그룹의 활동을 내년 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함으로써 결정은 또 미뤄졌다. 지질공원의 성공적인 운영과 더불어 현재 지역적인 편중, 지질공원 운영 절차 등에 대한 회원국의 우려를 없애고 지지를 확대하는 게 현재의 과제로 보인다.
—-
관련기사
[유네스코 총회 분야별 하이라이트]
– [정보커뮤니케이션] 인터넷 이슈관련 국제규범화 사실상 무산
– [문화] 박물관 관련 국제표준규범을 둘러싼 논쟁
– [교육] 2015년, 새로운 미래교육의제의 교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