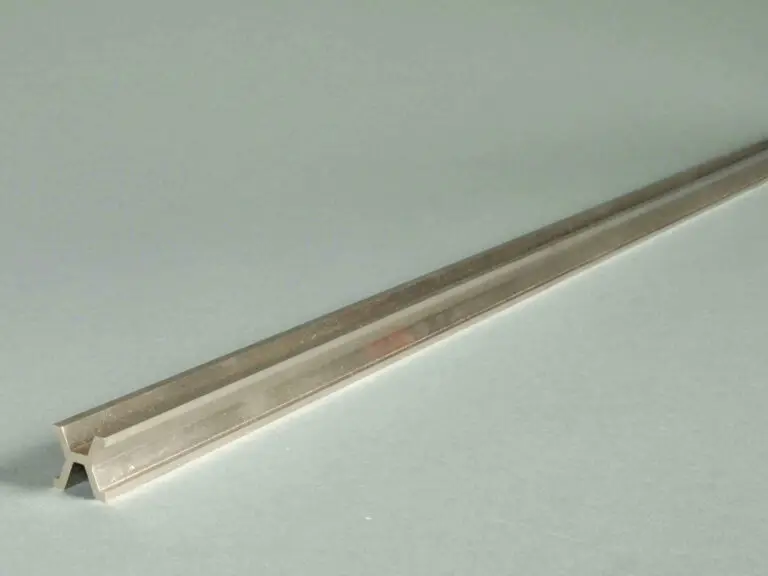지난주에 샨타 레트나싱암 유네스코 민간 재원 모금 과장이 대표부를 찾아왔다. 그는 한위 60주년 기념식을 맞아 방한하는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수행할 예정이며 한국 체류 기간 중 한국 기업 관계자와 폭넓게 교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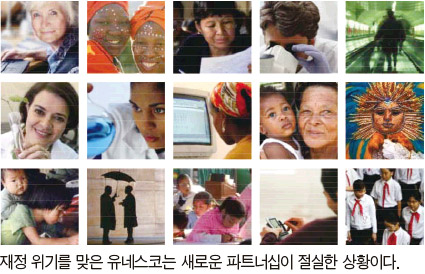
레트나싱암 과장은 현재 유네스코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2005년부터 외부 재원 모금을 총괄하여 파라소닉,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예거르쿨트르, P&G, 젬스에듀케이션 등 유수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는데, 유네스코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역할은 막중할 수밖에 없다. 2013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제출된 통계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민간 후원금 2억 5600만 달러를 유치했다고 한다.
한국에서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유네스코 후원은 아직 미개척의 영역이다. 2000년대 이후 대략 한국의 유네스코 정규 분담금은 2년 회기 중 1400만 달러 규모로 11~13위, 비정규 기여금은 약 1200만 달러로 4~7위 정도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는 최근 조계사의 아이티 교육재건 지원(40만 달러), 삼성의 베트남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100만 달러)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편이다. 세계 곳곳에서 선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보면 아쉬운 대목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언론계에서 재정 기여 외 사업 협력을 위해 유네스코와 체결한 파트너십을 포함하더라도 한국 기업의 유네스코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제휴 가능성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거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기여 수준을 넘어 유네스코와의 파트너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은 기업뿐만이 아니다. 현재 유네스코와 공식 관계에 있는 NGO가 총 373개(자문지위 307개, 제휴지위 66개)이고 재단이 24개인데, 이 중 한국은 대전과학도시연합, 세계무술연맹 등 자문지위 NGO 2개가 전부인 상황이다. 한국의 시민사회와 비정부 부문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대학 및 연구소 등 학계와의 대표적인 파트너십인 유네스코 석좌교수/유니트윈 지위가 국내에 7개가 있지만 국제적으로 가시적인 활동이 없어 추진 당시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밖에, 우리나라가 2012~14년 의장국을 수임한 유네스코 아태지역교육의원연맹(FASPPED)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 노력도 필요하다.
유네스코 카테고리2센터 98개 중 한국의 아태국제이해교육원,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우수 사례로 언급되고 있어 고무적이지만, 카테고리2센터는 설립 준비와 협정 체결에 정부가 관여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차원의 파트너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변화의 시점이 왔다. 한국의 대 유네스코 외교 역량이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 차원의 참여와 파트너십의 양적·질적 총량과 비례한다고 가정할 때, 기업 언론 대학 연구소 국회 NGO 등의 유네스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비재정적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는 한-유네스코 간 이해 관계를 더욱 입체적이고 다변화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슈에 따라 필요한 외교적 가용 자원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유네스코가 지난 회기에 거둔 성과 중 하나는 민간, 시민단체, NGO, 협동학교, 협회, 석좌, 카테고리2센터, 직업기술교육훈련센터, 명예친선대사 등을 두루 아우르는 ‘유네스코 파트너십 종합전략’(Comprehensive Partnership Strategy)을 수립하고 이를 사업계획의 이행에 긴밀히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유네스코는 지속되는 재정위기로 인해 사무국 조직이 급속히 축소되고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새로운 회기를 맞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는 시험대에 서 있다. 예산 규모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타개책은 60여 년간 쌓아 온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 추진과 성과의 새로운 동력과 양태로 확립하는 곳에 있다. 새해, 유네스코에게는 파트너십만이 희망이다.
강상규 주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 주재관